
수천 년 전, 깊은 숲속에 사는 한 부족이 있었다. 이들은 질병과 자연재해를 두려워했으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 다행히 부족에는 이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샤먼(Shaman)이라 불렀다.
샤머니즘은 인류가 처음으로 신과 교류한다고 믿었던 종교 형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토템을 숭배하거나(토테미즘), 조상 영혼 또는 나무 정령과 소통하는(애니미즘) 원시 종교도 존재했다. 이 3가지 원시적 종교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종교들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원시 종교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 글에서는 종교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네 가지 주요 이론
1) 심리적 기원설: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존재다. 특히 죽음, 질병, 자연재해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은 고대인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예를 들어, 원시인이 갑자기 발생한 폭풍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려 애썼을 것이다. 결국 그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의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사나 의식으로 그의 노여움을 달래었다.

이처럼 종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발전했다는 것이 심리적 기원설의 핵심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종교를 통해 위로와 의미를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이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능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수천명 단위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신의 뜻”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으며, 그 권위를 신성시하는 것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또한, 종교는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신의 뜻인데 뭐 어쩠겠는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인지적 기원설: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데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본 원시인이 이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본능이 확대되면서 자연현상 뒤에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이 발전하면서, 자연현상이나 삶의 사건에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것이 신의 존재를 믿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즉, 종교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4) 철학적 기원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종교가 '인간이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철학적 탐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종교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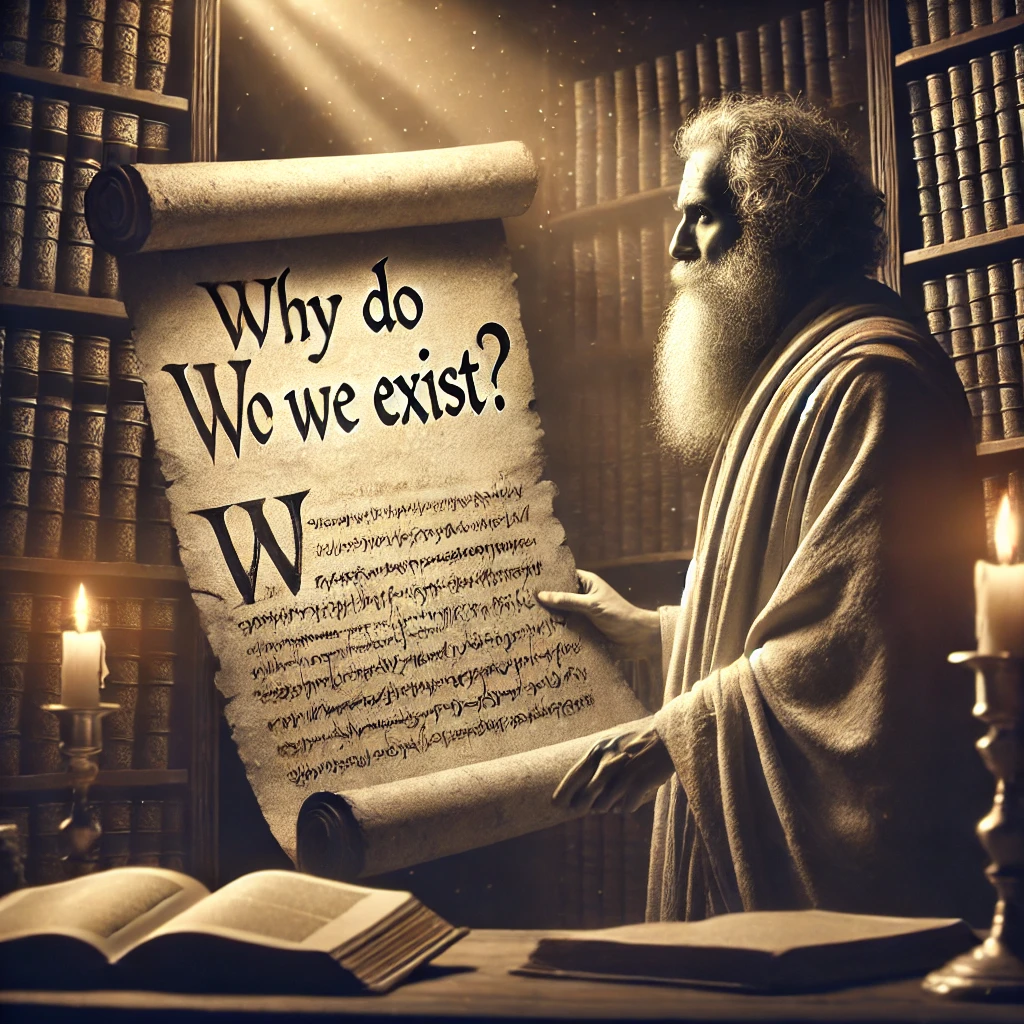
예를 들어, 불교는 삶의 고통과 윤회를 탐구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철학적 체계로 발전했다. 유교 또한 도덕적 삶과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철학적 종교로 자리 잡았다. 즉, 종교는 신앙의 형태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목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 결론: 종교는 부조리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다
삶은 부조리하다. 잘 살던 사람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잘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더 심했다. 원시 사회에는 체계적인 지식과 정치 체제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조리한 일이 생겨도 도움 받기가 힘들었다. 사랑하는 이가 시름시름 앓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신에게 기도하는 수 밖에 없었다. 종교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불확실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는 왜 쉬고도 피곤할까? 제대로 쉬는 법 4가지 (0) | 2025.02.22 |
|---|---|
| 실패한 노력은 무의미할까? – 노력의 본질과 그 가치에 대한 고찰 (0) | 2025.02.20 |
|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좋은 관계에 필요한 5가지 조건 (0) | 2025.02.17 |
| 인간관계를 전략적으로 맺어야 할까? 유유상종과 계산적인 관계 맺기의 딜레마 (0) | 2025.02.15 |
|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0) | 2025.02.15 |



